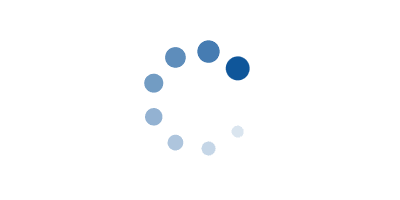사음(舍音)은 지주를 대신해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이다. 사음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 전서방, 박서방, 이서방, 최서방의 집으로 간다. 하지만 서방들은 죄다 없고 아내들만 집에 있다. 사음은 아내들에게 소작료를 내라고 독촉하지만 하나같이 낼 돈이 없다고 한다. 사음은 소작료를 내지 않으면 이듬해엔 땅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나, 모두 밑지는 농사는 짓고 싶지도 않다며 그의 말을 무시한다. 사음은 지주에게 돌아가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지주는 소작료를 받는 게 사음의 일이라며 신경도 쓰지 않는다. 한편 면사무소에 간 전서방, 금융조합에 간 박서방, 비료회사에 간 이서방, 학교에 간 최서방은 하나같이 빚 독촉에 시달린다. 재산을 차압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아도 어느 하나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네 사람은 집단행동을 하기로 맘을 모은다. ‘도(道)에서온사람’은 음력 섣달그믐에도 아직까지 타작하지 않은 벼를 보곤 부촌(富村)이라 감탄한다.
채만식은 <부촌>의 작자부언에서 “그런데 소설도 아니요, 희곡도 아니요, 시나리오도 물론 아니요, 라디오드라마……라고 하기 어려운 이것을 나 역시 무어라고 이름 지었으면 좋을지 모른다.”라고 밝히고 있다. 덧붙여 그는 “또 한 가지 재료에 있어서 소설이나 희곡으로써 장만해내기는 부적당하면서”라며 작품의 장르를 정함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. 작가는 이러한 고민을 담아 작품의 장르를 ‘대화소설’이라고 정하였다. 즉 소설이나 희곡이라는 어느 한 장르를 통하기보다 이 둘의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 주제의식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. <부촌>에서는 1~4장, 6~9장이 동일 구조로 반복되어 나타난다. 전자는 사음의 소작료 독촉과 더불어 타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, 후자에서 빚을 독촉하는 여러 기관에 대한 거부가 담겨 있다. 각각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, 그 대사와 행동은 한결같다. 이는 당시 농민들이 겪었던 가난과 불행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구조적 모순으로 비롯되었음을 암시한다. 농민들은 결국 자신들이 아니면 지주, 금융조합, 학교가 유지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집단행동으로 위기에 대처하기로 한다. 농민들의 집단행동으로 타작하지 않은 벼들이 집집마다 쌓여있는 것도 모르고 이 마을이 부촌이랍시고 감탄하는 ‘도(道)에서온사람’의 모습을 통해 채만식은 농촌 현실을 역설적으로 풍자하고 있다.

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